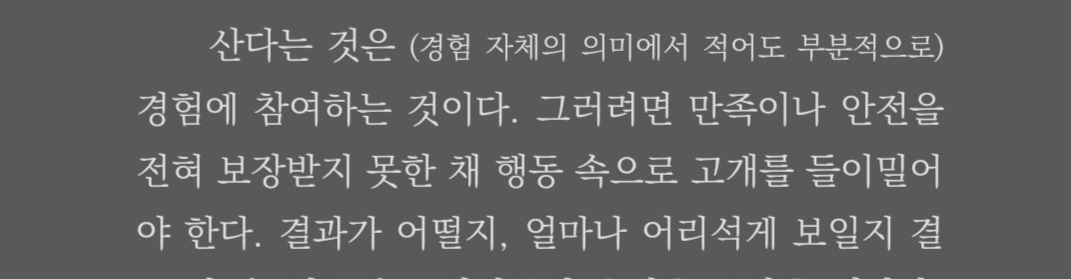
죽음의 부정이란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산다는 것은 만족이나 안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행동 속으로 고개를 들이미는 것인데
실상 그 반대일 때가 많지 않나 싶어요.
만족이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를 대며 경험에 참여하기를 꺼립니다.
그게 인간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소한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내키는 대로 뛰어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대학원이 그랬고 결혼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 때는 붙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순진하게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운 좋게 잘 풀렸죠.
결혼 때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직장생활 고작 3년 한 시점이었고 집 때문에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릴 형편도 안 됐어요.
그래도 지금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올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상담을 주로 하는 장면으로 이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담 장면에서 절 써줄 곳이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뛰어들어 보는 중입니다. 제가 흥미를 느끼고 또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죽음의 부정에서 정말 인상적인 대목이 많지만 그 중 하나는 신에게 인간은 공룡과 다를 게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자의식은 스스로를 신의 위치로까지 격상시킬 수 있지만 죽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자 다양한 성격 갑옷을 만들고, 죽음의 부정을 쓴 어니스트 베커에게 모든 성격은 그 자체로 신경증적입니다.
인간이 성격 갑옷을 벗고 참자기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듯합니다. 예수나 부처 같은 성인만이 가능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정 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것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내보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스스로가 규정한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
삶이라는 경기장에 들어서 당당히 실패를 무릅쓰는 것(브레네 브라운의 유명한 말이죠),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듯해요.



댓글